| 【신기술 1】 100여 년의 난제 해결로 탄소 중립 사회 구축에 한 걸음 더 | |
| 2022-03-01 | |
 100여 년의 난제 해결로 탄소 중립 사회 구축에 한 걸음 더 전기 이중층 구조 규명…전기에너지 변환·저장 성능 향상 기대 전기 이중층은 모든 종류의 전기화학 기술의 작동원리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배터리와 인공광합성 기술 등 다양한 전기화학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전기 이중층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난 100여 년간 진행됐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전기 이중층은 전기를 가한 금속 전극 주변에 액체 속 이온이 쌓이며 생성되는 층의 구조다. 이 구조에 따라 에너지변환과 저장 성능이 결정되기에 그 구조와 원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새로운 분자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해 ‘전기 이중층 축전량’을 계산해 이산화탄소의 전기화학적 전환 반응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냈다. 이 연구는 추후 다양한 전기화학 기술의 새로운 성능 제어전략 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리 최종숙 기자 자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기화학 기술은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를 상호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로 연료전지, 배터리, 인공 광합성, 온실가스 전환 등의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기화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에너지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자연계 화학물질 순환 구조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이에 신재생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인류가 필요한 화학 물질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전기화학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처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화학연료 형태로 변환·저장하는 기술은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벨 화학상 수상에서도 볼 수 있듯 전기화학 기술은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의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코어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든 종류의 전기기술 작동원리에서 전기 이중층은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다. 전기 화학 반응을 위해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해질 내 이온이 전극 주변에 축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특별한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바로 전기 이중층이라 부른다. 이 전기 이중층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전기화학 반응의 성능이 결정되며, 에너지의 변환과 저장 성능도 결정된다. 이를 이용한 배터리와 인공광합성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이 모든 기술에 필수로 등장하는 전기 이중층이라는 특별한 액체 구조에 대한 규명은 100여 년 동안 풀리지 못한 숙제였다. 금속 전극과 액체 전해질 사이 계면에 파묻혀 생성되는 나노 크기의 공간 속에서 물과 이온들의 복잡한 배열을 가지는 구조로, 직접 관측은 불가능한 영역이었기에 지난 수십 년간 뚜렷한 규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험적 한계 극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연구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소재공학부 연구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전기 이중층 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전기 이중층을 구현해 그동안 있었던 실험적 한계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기 이중층 구조 규명해냈다.1)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분자 시뮬레이션2)은 양자 역학 및 분자 동역학에 기반한 DFT-CES라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전기 이중층 축전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이중층 축전량’은 전기 이중층의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값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값의 변화와 전기 이중층 구조 변화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DFT-CES를 통해 전기 이중층 구조의 변화가 축전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는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값과 정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했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결과는 GIST 연구팀이 실제로 실험에서 측정한 전기 이중층의 물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주인-손님 화학’(특정 ‘손님’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인’ 분자의 특이한 화학적 성질을 의미)이라는 특별한 화학 반응을 활용해 전기 이중층 구조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탄소 저감에 중요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의 연료화 반응 효율 제어에 성공했다.  KAIST 연구팀은 전기 이중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화학적 전략을 제시해, 온실가스의 대표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전기화학적 전환 반응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화학 분야의 지난 수십 년간의 난제인 “전기 이중층의 구조는 무엇인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라 할 수 있을뿐더러, 연료전지, 배터리, 온실가스 전환 등 다양한 전기화학 기술의 성능을 전기 이중층 구조 변화를 통해 제어하는 새로운 성능 제어 전략을 도출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 속 수소이온 이동 특성 규명 한편, 작년 4월 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는 세라믹 연료전지 재료 속 수소이온의 이동 특성을 규명해 낸 연구가 있었다.3) 이 연구는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내 수소이온(양성자) 확산 정량화에 최초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세라믹 연료전지는 화학연료를 전기로 직접 변환하는 전기 화학 장치다.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성과 오염물질 배출이 낮고 수소나 메탄 등 다양한 연료 사용 가능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양성자 세라믹 연료전지(PCFC)는 중저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더욱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수소를 중수소로 교환해 수소이온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추적하는 기법을 고안해 삼중 전도 산화물(TCO)의 한 종류인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를 실험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는 PCFC의 양극 소재로 주목받는 물질이다. 양극 내에서 수소이온의 확산 특성은 연료전지 성능에 영향으로 주지만, 작고 가벼워 다른 전도 입자와도 상호작용해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의 김건태 교수 연구팀은 수소를 더 무거운 동위 원소인 중수소로 바꾼 뒤 이를 추적하는 기법을 썼다. 고온을 이용해 중수(중수소가 많이 포함된 물, D2O)를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에 주입한 뒤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절단면을 훑어가면서 중수소 이온의 농도 변화를 측정(동위원소 교환 확산 프로파일)했다. 단면 위치별로 농도차를 이용하면 수소이온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소 이온 농도 측정에는 2차 이온 질량분석법을 이용했다. 이 방식은 이온광선(1차 이온)을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에 충돌시킨 뒤 튕겨 나오는 이온(2차 이온)을 분석해 구성 원소 종류와 농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의 수소이온 확산 계수를 구한 결과 550 ℃에서 1.04×10-6 ㎝2s-1의 값을 얻었다. 이는 기존에 밝혀진 이 물질의 산소 이온 확산 계수보다 100배가 넘게 빠른 수치이다. 확산계수는 입자의 이동 속도에 비례하는 값으로, 확산계수에 농도차를 곱해 1초 동안 1 ㎠를 통과하는 수소이온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물질을 쓴 PCFC 단위전지(cell)는 500 ℃에서 0.42 W㎝-2의 최대 전력 밀도를 나타냈다. 수소이온 확산계수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한다. 전력밀도가 높으면 한 번에 많은 힘을 내는 고출력 발전이 가능하다. --------------------- 1)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사업 및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 1월 10일 자로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On the importance of the electric double layer structure in aqueous electrocatalysis”이다. 2) 컴퓨터 성능의 증가와 슈퍼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컴퓨터를 통한 가상 모의실험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오로지 기본적인 물리학적 법칙 (예, 양자역학)에 기반해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며, 이를 분자 시뮬레이션이라한다. 3) 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의 김건태 교수팀과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시바프라카시 생고단(Sivaprakash Sengodan) 교수, 메이린 리우(Meilin Liu) 미국 조지아텍 교수, 최시혁 금오공대 교수도 참여한 이 연구는 과학저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온라인판에 작년 3월 25일 자로 게재됐다. 논문명은 “Electrokinetic proton transport in triple (H+/O2-/e-) conducting oxides as a key descriptor for highly efficient protonic ceramic fuel cells”이다.


< Energy News > |
|
- [전기기술] 분류 내의 이전기사
-

【신기술 2】 낙엽으로 폐전지와 산림 문제 해결을 동시에
낙엽으로 폐전지와 산림 문제 해결을 동시에폐자원인 낙엽 이용해 친환경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개발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폐자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
2022-03-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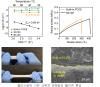
【신기술 2】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고체 전해질 상용화 성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고체 전해질 상용화 성큼고체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높이고 덴드라이트 막는 기술수계 전해질 배터리 외에도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배터리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상
2022-02-01 -

【신기술 1】 화재로부터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
화재로부터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주원인인 산소 발생현상 규명, 수계 전해질 배터리 기술도리튬이온 배터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전해질에 가연성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와 화재의 위험성
2022-02-01 -

【신기술 2】 수소와 전기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원 ‘물’
수소와 전기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원 ‘물’PEM수전해 효율 높이는 기술, 미량의 물 이용한 발전지구상의 물은 모습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비와
2022-01-01 -

【신기술 1】 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탄소중립 기여 기술
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탄소중립 기여 기술값싼 Sn(주석) 기반 촉매, 이퓨얼 만드는 마이크로채널 반응기이산화탄소에 전기를 가해 이를 고부가가치의 화합물이나 연료를 바꾸는 기술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22-01-01